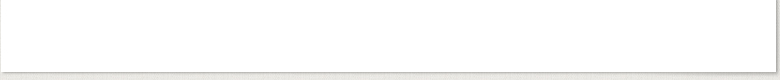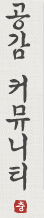공감커뮤니티 > 리더십 컬럼
위기 리더십(Leadership in crises)|
 김 호
김 호
 2014-07-10
2014-07-10
 30,427
30,427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위기 리더십(Leadership in crises)’ 프로그램은 2001년 개설,
그동안 50개국 700여명 리더가 참여한 글로벌 국가 위기관리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 1주일 동안 참여하면서 얻은 교훈 10가지를 세월호 참사와 연결해 소개한다.
1. 지휘관 모자를 함부로 받지 말라
미국은 위기 상황에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거나, 가장 전문성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현장 지휘관이 결정된다. 9·11 사태 당시 펜타곤(미 국방부 청사)이 공격을 받자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알링턴 소방서의 ’넘버2’였던 제임스 슈월츠였다. 현장 지휘관은 펜타곤에 머물던 럼즈펠드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슈월츠로 정해졌다. 뒤늦게 도착한 슈월츠의 상사도 "현장에 대해서는 자네가 나보다 더 많이 파악하고 있으니 지휘를 자네가 맡게"라고 말하고 다른 업무를 도왔다.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우리 정부는 현장도 모르고 전문성도 없는 사람들이 직급에 따라 지휘관을 맡았다가 혼란만 자초했다.
2. 가장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나온다(First In, Last Out)
2009년 1월 뉴욕 상공에서 엔진이 고장 난 비행기를 과감하게 허드슨강에 불시착시키면서 승객과 승무원 155명을 모두 구한 체슬리 설렌버거 기장. 그는 마지막까지 비행기 안에 남아있는 사람이 더 없는지 두 번이나 둘러보고 탈출했다. 2005년 뉴욕 소방관인 존 살카는 뉴욕소방서로부터 배우는 리더십에 대한 책을 쓰면서 책 제목을 ’가장 먼저 들어가, 마지막에 나와라(First In, Last Out)’로 달았다. 자기 이름을 걸고 책임지는 모습, 그것이 리더다.
3. ’순간 탄력성’을 발휘하라
설렌버거 기장은 엔진 고장이 발견되자 조종간을 잡고 창밖 뉴욕 시내를 보면서 재빨리 3차원 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렸다. 관제탑에서는 주변 공항으로 유도하려 했으나, 그는 엔진이 꺼진 상태에서 뉴욕 상공을 낮게 날다가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음을 직감하고, 허드슨강에 과감하게 불시착을 감행했다. ’바르고 빠른’ 판단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순간 탄력성’이라 부르는데, 경험과 훈련의 산물이다. 설렌버거는 1만9500시간 비행 경험과 함께 정기적으로 위기 대응 훈련 교육을 받았다. 비록 교실 수업이긴 했지만 물 위에 착륙하는 연습도 했다. 글로벌 기업들은 매년 정기적으로 CEO와 임원을 위주로 위기관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다. 화학·제약·식음료 등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큰 산업군에서 더 적극적이다.
4. ’헤드 퍼스트(Head First)’ 대응에서 벗어나라
개인 정보 유출 사건 때 카드 회사들은 무방비 상태였다. 위기 대응력을 훈련한 적도 없고, 대응 전략도 세우지 못했으며, 준비된 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위기를 맞았다. 결국 당국 브리핑이나 뉴스 보도가 나오면 코를 박고 수세적으로 해명하거나, 변명하고 부정하는 답변을 만드는 데 급급했다. 이를 ’헤드 퍼스트(제대로 생각도 해보지 않고 성급하게)’ 방식이라 한다. 위기일수록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고 전략을 세워야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위기에 닥치면 반드시 상황실(War Room)을 만들라. 그사이 두드려 맞더라도 반드시 사건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전략을 세운 뒤 목표를 정해서 대응하라.
5. 기대치를 관리하라(Expectation Management)
세월호 사고 첫날 정부는 구조자 수를 368명으로 발표했다가 164명→174명→175명→176명으로 번복한 뒤 결국 179명으로 발표했다. ’대다수 구조’에서 ’대다수 실종’으로 돌아선 발표는 위기관리에서 최악의 실수로 꼽힐 것이다. 사람 심리에는 대비 효과가 있어 기대를 올려놓았다가 급격히 낮추면 희망적 기대치와 참담한 현실 사이 엄청난 간극이 생겨 더 큰 불행과 분노를 낳는다. 영국 정부가 런던 지하철 테러 사건 당시 통계 자료를 확실히 확인할 때까지 언론 발표를 계속 미루었던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글로벌 기업 위기관리 프로세스 첫 단계는 예외 없이 사실 수집과 확인이다.
6. ’레드팀(Red Team)’을 두라
미국 드라마 ’뉴스룸’을 보면 어느 대형 사건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보도 책임자가 주인공인 메인 앵커에게 ’레드팀’을 맡아달라고 한다. 레드팀은 쉽게 말해 딴죽을 거는 역할을 한다. ’화이트팀’의 보도가 정확하고 근거가 있는지를 검증해 달라는 것. 믿고 싶은 대로 사실을 편집하려는 유혹에 대한 견제 조치다. 글로벌 기업들은 위기에 대비해 ’테러리스트 게임’을 한다. CEO와 임원에게 소비자, 정부, 시민단체, 언론 등 여러 이해관계자 역할을 맡기고, 그들 입장에서 기업을 공격할 수 있는 요소를 모두 찾아내도록 하는 것이다.
7. ’위기관리의 위기’를 만들지 말라
보통 위험이 발생했을 때는 두 개의 위기가 동시에 발전한다. 하나는 위험 그 자체, 또 하나는 그 위험에 대한 대처로 인한 위기다. 올 초 여수와 부산에서 두 개의 유조선 사건이 잇따라 일어났다. 사실 부산 앞바다 사건이 유출량도 많고 더 위험했다. 그런데 여수 사건은 해경의 초기 대응 미숙으로 인해 대형 해양 사고라는 기억으로 남았지만, 부산 사건은 발 빠른 초기 대응으로 후폭풍이 미미했다. 기름 범벅이 된 채로 배에 매달려 헌신하는 두 해경 경위에 대한 미담만 퍼졌을 뿐이다. 위기라는 소나기는 위기관리 과정을 거치면서 태풍이 될 수도 있고 소멸할 수도 있다.
8. 위기에 닥쳐서 명함을 나누면 안 된다(First Name Relationship)
미 연방재난관리청 고위 관료였던 리처드 세리노가 한 말이다. 재난이 발생하면 다양한 정부 부처, 군, 경찰, 기업이 협조해야 하는데, 위기가 난 뒤에야 처음 만나 인사 나눈다면 제대로 팀워크가 작동될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해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전후 대응 과정을 연구한 하버드대 박소령씨는 ’편하게 이름을 부르는 관계(First Name Relationship)’에 주목했다. 당시 위기관리에 뛰어들었던 구성원들은 이미 9·11 테러 이후 매사추세츠 재난관리청 주관하에 지속적인 재난 대비 훈련을 해온 친한 사이였고, 이 관계가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냈다.
9. 빠르게 자주 소통하고 협력하라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아널드 호윗 교수는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4가지로 정리한다.
①알고 있는 사실만 말해야 한다: 확인된 사실만 소통해야 하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는 여기부터 실수를 저질렀다.
②취하고 있는 조치를 말해야 한다: 조치를 하는 것 못지않게 이를 빨리 자주 커뮤니케이션하는 게 중요하다.
③시민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야 한다: 현장 인력, 피해자 가족, 정부, 정치인, 시민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10여개 대책본부와 선사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별도 브리핑을 한 건 치명적인 잘못이다. 보스턴 마라톤 테러 사건 때처럼 합동 브리핑을 해야 했다.
④위기에 대한 해석을 제공해야 한다: 중대한 국가재난이 발생하면 리더는 국민이 위기로 인한 혼돈과 트라우마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해석을 내려야 한다. 9·11 사태 당시 조지 부시 대통령은 ’강한 미국’이란 메시지를 전했고, 테러 6일 뒤에 ’일상 복귀’를 선언했다. 세월호 사건에서 비난과 징벌 메시지는 난무하지만.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이를 극복할 것’이란 의지의 표현은 부족하다.
10.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Internal Listener)’이 필요하다
위기관리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제대로 관심을 받지 못한 분야는 ’피해자 관리’다. 신속한 구조 대책과 함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그 대책 중에는 ’옆에서 들어주는 사람(Internal Listener)’ 역할이 포함돼야 한다. 피해자 가족의 심리적 공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응급 의료 지원과 심리적 상황을 관리해 주는 사람이다. 미국에서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나 병원 핵심 관계자가 환자 옆에 앉아 환자 가족 이야기를 듣도록 하고 있다. 환자와 같은 쪽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심정을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호 / 더랩에이치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