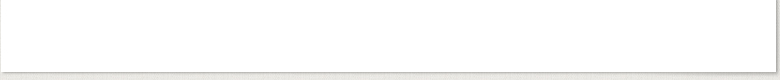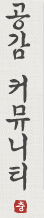공감커뮤니티 > 리더십 컬럼
패션계의 리더십 - 폴 스미스 품성은 그의 패션과 같았다
 관리자
관리자
 2011-07-29
2011-07-29
 53,579
53,579
패션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무언의 언어다.
옷차림에서부터 안경, 신발, 혹은 펜 같은 소품까지 한 사람의 패션은 그 사람의 품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향, 혹은 취향에 대한 많은 것을 짐작하게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치장’을 한 사람과 마주치거나 이 구석, 저 구석 번쩍이게
만든 차를 도로 위에서 발견하게 될 때면 나는 가끔 물끄러미 바라보곤 한다.
정말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저 온갖 치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디자이너 폴 스미스는 지난해 방한을 앞두고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가장 까다로운 일 중 하나가 인터뷰이를 섭외하는 것이건만 안 그래도
인터뷰하고 싶던 그가 우리 프로그램에만 출연하고 싶다고 자원했으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분 좋은’ 이례적인 행동은 자원 출연이 다가 아니었다.
인터뷰가 있던 날 아침, 인터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는 독특한 인상을 심어주며 인터뷰
장소로 들어서고 있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매장을 가진 패션왕국의 소유주지만 그는 알려진
사람들에게 있을 법한 흔한 태도, 말하자면, 특별한 대접이나 상황을 요구하는 그 무엇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보통의 경우 인터뷰이가 도착하기 전에 인터뷰어가 먼저 도착해 손님을 환영하지만 그는 이런
나름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깨버린 첫 번째 인물이었다.
인터뷰이가 도착했다는 전갈을 받기도 전에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들어선 것은 바로
폴 스미스였다.
“오늘 나와 인터뷰할 당신을 직접 빨리 만나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요”라는 인사와 함께.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인사를 나눈 이 백발의 장인은 스튜디오의 구석구석을 마치 호기심 천국에 온
장난꾸러기 소년처럼 휘젓고 다니며 관찰하고 있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그의 얼굴은 ‘이 모든 것이 정말 재미있고 신난다’는 듯한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겐 모든 순간이 새로움이었고 그는 그 새로움을 작은 조각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고, 그런 그의
태도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았다.
그는 말했다.
처음 만나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고 그는 그 새로움을 관찰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영감을 주는 디자인의 원천이라고. 사실이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관찰하는 눈은 예리했지만 그의 태도는 어떠한 예민함도 찾아볼 수 없는 편안함으로 주변을 끌어안는
듯했다. 그것이 그의 독특함이었다.
인터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그의 독특함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품성이었다.
그는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중심에 슬쩍 밀어넣고 자신은 관찰자가 되는 것이었다.
자신이 중심에 서있을 때 모든 사람은 그를 바라보게 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주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지혜로운 관찰자였다.
폴 스미스 브랜드의 상징인 반전의 안감은 그의 이러한 성향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만드는 옷 중의 상당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평범한 정장이지만 속살을 헤치고
보면 안감에는 늘 장난스럽거나 도발적인 컬러와 디자인이 숨어 있다.
문뜩 일본의 영화 감독 겸 배우인 기타노 다케시의 일화를 읽은 것이 기억난다.
포르셰 자동차가 꼭 갖고 싶었던 기타노 다케시는 어느 날 드디어 포르셰를 구입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운전을 시작한 순간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라고 깨달았다.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 멋진 포르셰를 제 눈으로 볼 길이 없지 않은가!
실망한 그가 한 일은 친구 부르기였다.
친구에게 포르셰를 운전하게 한 뒤 자신은 택시를 타고 그 뒤를 따라다니며 그 차가 멋지게
달리는 모습을 실컷 구경한 후에야 그것을 구입한 행복감을 맛보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치장을 하는 것일까.
명품을 입고 싶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명품을 즐기기 위함인가, 아니면 명품을 입은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인가.
폴 스미스와 기타노 다케시의 일화에는 겹치는 구석이 있다.
기타노 다케시는 남들이 보는,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포르셰가 아니라 자신이 볼 수 있는
포르셰를 원했다.
폴 스미스 또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아닌, 남들이 보지 못하고 오직 그 옷을 입는
나만을 향해 열려 있는 곳에 이야기를 숨겨 놓았다.
패션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패션으로 자신을 말하고,
남을 듣는다는 것이다.
백지연 /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
옷차림에서부터 안경, 신발, 혹은 펜 같은 소품까지 한 사람의 패션은 그 사람의 품성까지는
아니더라도 성향, 혹은 취향에 대한 많은 것을 짐작하게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빈틈없이 ‘치장’을 한 사람과 마주치거나 이 구석, 저 구석 번쩍이게
만든 차를 도로 위에서 발견하게 될 때면 나는 가끔 물끄러미 바라보곤 한다.
정말 궁금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저 온갖 치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디자이너 폴 스미스는 지난해 방한을 앞두고 ‘백지연의 피플인사이드’에 출연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가장 까다로운 일 중 하나가 인터뷰이를 섭외하는 것이건만 안 그래도
인터뷰하고 싶던 그가 우리 프로그램에만 출연하고 싶다고 자원했으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그의 ‘기분 좋은’ 이례적인 행동은 자원 출연이 다가 아니었다.
인터뷰가 있던 날 아침, 인터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는 독특한 인상을 심어주며 인터뷰
장소로 들어서고 있었다. 전 세계 수백 개의 매장을 가진 패션왕국의 소유주지만 그는 알려진
사람들에게 있을 법한 흔한 태도, 말하자면, 특별한 대접이나 상황을 요구하는 그 무엇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다.
보통의 경우 인터뷰이가 도착하기 전에 인터뷰어가 먼저 도착해 손님을 환영하지만 그는 이런
나름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깨버린 첫 번째 인물이었다.
인터뷰이가 도착했다는 전갈을 받기도 전에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들어선 것은 바로
폴 스미스였다.
“오늘 나와 인터뷰할 당신을 직접 빨리 만나고 싶어서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요”라는 인사와 함께.
마치 오랜 친구처럼 인사를 나눈 이 백발의 장인은 스튜디오의 구석구석을 마치 호기심 천국에 온
장난꾸러기 소년처럼 휘젓고 다니며 관찰하고 있었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그의 얼굴은 ‘이 모든 것이 정말 재미있고 신난다’는 듯한 표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에겐 모든 순간이 새로움이었고 그는 그 새로움을 작은 조각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고, 그런 그의
태도는 모든 정보를 그대로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았다.
그는 말했다.
처음 만나는 모든 것은 새로운 것이고 그는 그 새로움을 관찰한다고.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영감을 주는 디자인의 원천이라고. 사실이었다.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었다.
관찰하는 눈은 예리했지만 그의 태도는 어떠한 예민함도 찾아볼 수 없는 편안함으로 주변을 끌어안는
듯했다. 그것이 그의 독특함이었다.
인터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그의 독특함이 어디서 기인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의 품성이었다.
그는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애쓰지 않았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중심에 슬쩍 밀어넣고 자신은 관찰자가 되는 것이었다.
자신이 중심에 서있을 때 모든 사람은 그를 바라보게 되지만 정작 그 자신은 주변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듯했다.
그는 지혜로운 관찰자였다.
폴 스미스 브랜드의 상징인 반전의 안감은 그의 이러한 성향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만드는 옷 중의 상당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차분하고 평범한 정장이지만 속살을 헤치고
보면 안감에는 늘 장난스럽거나 도발적인 컬러와 디자인이 숨어 있다.
문뜩 일본의 영화 감독 겸 배우인 기타노 다케시의 일화를 읽은 것이 기억난다.
포르셰 자동차가 꼭 갖고 싶었던 기타노 다케시는 어느 날 드디어 포르셰를 구입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
그런데 그가 막상 운전을 시작한 순간 그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게 아니야’ 라고 깨달았다.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고 있는 동안에는 그 멋진 포르셰를 제 눈으로 볼 길이 없지 않은가!
실망한 그가 한 일은 친구 부르기였다.
친구에게 포르셰를 운전하게 한 뒤 자신은 택시를 타고 그 뒤를 따라다니며 그 차가 멋지게
달리는 모습을 실컷 구경한 후에야 그것을 구입한 행복감을 맛보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치장을 하는 것일까.
명품을 입고 싶어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명품을 즐기기 위함인가, 아니면 명품을 입은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인가.
폴 스미스와 기타노 다케시의 일화에는 겹치는 구석이 있다.
기타노 다케시는 남들이 보는, 혹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포르셰가 아니라 자신이 볼 수 있는
포르셰를 원했다.
폴 스미스 또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아닌, 남들이 보지 못하고 오직 그 옷을 입는
나만을 향해 열려 있는 곳에 이야기를 숨겨 놓았다.
패션에 정답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만의 방법으로, 패션으로 자신을 말하고,
남을 듣는다는 것이다.
백지연 / 커뮤니케이션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