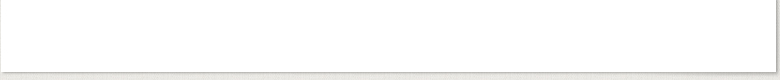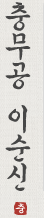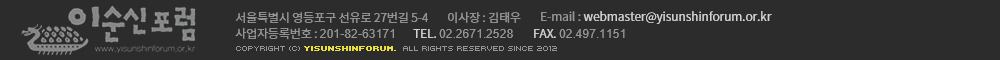충무공 이순신 > 이순신 리더쉽
조선수군의 원혼(寃魂)- (2011. 06. 27)
 관리자
관리자
 2011-06-28
2011-06-28
 22,142
22,142
나는 파도에 떠다니는
이름없는 조선의 수군이다.
왜놈의 총탄을 피하지 못하고
한 많은 나의 목숨은 전쟁에서 벗어났다.
출렁이는 바다에 누워 조상님들께
대성통곡하며 큰절을 올리는데
두 눈이 시뻘건 조선 수군의 긴 갈고리에 걸려
목이 베어지고, 나는 한 번 더 바다에서 죽었다.
죽은 조선 수군의 목을 베어
동족(同族)의 원혼이 서린 수급(首級)으로
전공(戰功)이 빛나는 장계(狀啓)를 올리며
그 알량한 붓 끝에 뇌물을 실어 보내
조정에 출세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그토록 처참한 명령을 내린 장수는 누구였던가?
나는 두 번 죽었으나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파도에 뒹굴며 쓸리다가, 개벌 한쪽에
얼굴이 없어 대성통곡 울지도 못하고
풍랑에 곤두박질치며 온몸이 시커멓게 썩어간다.
나는 정처 없는 조선 수군의 원혼(寃魂)이다.
전쟁의 원한에 사무친
한 토막 허물어진 시신(屍身)
인육이 썩어가는 지독한 냄새 속으로
동백꽃 붉은 그림자가 일렁거린다.
봄 햇살 따스한 수평선 섬광(閃光)에서
남해 수많은 섬, 눈부신 물결에서
임금님의 멀고 만 망각에서
- 조신호의 [충무공 이순신 서사시] - 에서 발췌
오늘은 61주년을 맞이하는 6.25 전쟁 기념일 입니다. 임진왜란 때나
6.25 때나 나라를 지키다 스러져간 호국영령들은 모두가 한마음 한 뜻으로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을 것 입니다.
애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손자가 말하기를 [병(兵)이란 나라의
대사로서, 사생(死生)의 땅이요 존망의 길이니 잘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장수(리더)는 잘 살피고 따져서 병(兵)의 원혼들이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덕목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부경 올림
010-2228-1151/pklee95@hanmail.net